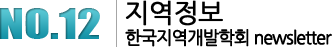다른 웹진 보기
국내외 사례
인구감소에 대응한 유럽과 독일의 축소도시
임형백(성결대학교 교수)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인구감소에 대한 유럽과 독일의 축소도시(shrinking city) 정책을 고찰하였다. 축소도시라는 용어는 H. Häußermann과 W. Siebel(1987)가 처음 사용했다. 또는 W. Rybczynsk와 P. D. Linneman(1996)이 처음 사용했다고도 한다. 축소도시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기 때문에 단일화된 정의를 찾기 어렵다.
선진국의 축소도시 정책을 고찰하기 이전에 유념하여야 할 것이 있다. 저출산과 이로 인한 노령화 및 인구감소는 선진국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또 한국의 노령화 인구의 비율은 아직 선진국 보다는 낮다. 반면 노령화 속도가 더 빠르다.
지난 두 세기에 걸쳐 도시들은 인구와 경제를 포함한 모든 측면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급속히 성장하여 왔으며, 개발도상국들도 최근에 들어와 도시화 추세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2013년 말 세계인구(약 71.6억명)의 약 53%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약 93.1억명의 인구 가운데 약 67%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인구도 1815년에 10억 명, 1900년에 16억 명, 그리고 2014년에 72억 명에 도달했다. 유엔인구국(UNPD)에 의하면, 4.5일마다 세계 인구는 100만 명씩 증가한다. 현재의 인구 증가 추세라면, 21세기 중반에 세계 인구는 90억-100억 명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전 지구적인 차원의 도시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모든 도시가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1950-2000년 동안 전 세계 도시들 가운데 350개 이상의 도시들은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경험하였다. 국제연합 인간거주계획(UN-HABITAT)의 『State of the World’s Cities(2008-2009)』에 따르면, 1990-2000년에 영국의 49개 도시와 독일의 48개, 이탈리아의 34개의 도시(인구 10만 이상)에서 인구가 감소했다. 구 소련권의 러시아, 동유럽에서도 많은 축소도시가 발생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는 약 100개 도시, 우크라이나에서는 약 40개 도시가 축소도시로 꼽히고 있다.
1. 유럽
1990년대만 하여도 EU에서 축소도시는 Liverpool이나 Leipzig 정도였으나, 이제는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다. 유럽에서 축소도시는 산업공동화(deindustrialization)와 교외화와 관계가 있다. 축소도시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공간변화(spatial changes)이다. 대도시 지역으로 경제적 활동이 집중되면서,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인구와 자본이 유출되고 있다. 둘째는 인구학적 변화이다. 저출산과 노령화로 유럽은 ‘늙은 대륙’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EU내 도시(cities)의 57%, 도시지역(urban regions)의 54%가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sustainable city) 개념으로부터 컴팩트 시티(Compact City, 압축도시)가 출발하였다. 중세 이탈리아의 소도시를 모델로 하여 제창된 이론이다. EU의 전신인 EC는 1990년 ‘Green Paper on the Urban Environment’ 발표를 계기로 하여, 1990년대 초부터 유럽도시정책으로 추진하였고, 본격적으로 EU의 1996년 ‘European Sustainable Cities’와 1997년 ‘Towards as urban agenda in the European Union’ 이후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유럽의 축소도시는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특히 산업지역(rust belts)에서 두드러진다. 한편 동유럽의 축소도시는 산업공동화와 사회주의 몰락이후 사회주의 사회‧경제 체제의 급격한 변화와 관계가 있다. 동유럽은 서유럽이 겪은 포드주의(Fordist)에서 포스트포드주의(post-Fordist)로의 변화를 더 단기간에 겪어야만 했고, 대부분의 국영기업이 파산하면서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졌다.
또 축소도시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크게 축소 상쇄(counteracting shrinkage)와 축소 수용(accepting shrinkage)으로 나뉘어진다. 전자는 다시 인구를 증가시키려는 정책으로 주로 중부, 동부, 남부 유럽에서 나타난다. 후자는 인구감소를 최대한 이용하려는 정책으로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북서부 유럽에서 나타난다.
2. 독일
1990년 통일 이후 독일에서 도시지역의 발달은 구 동독 도시지역에서의 상당한 인구유출과 구 서독 도시지역에서의 강력한 인구성장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1990년 독일통일 후 동독(GDR: German Democratic Republic)의 산업도시들이 겪었던 인구감소 때문에 축소도시의 개념이 널리 확산되었다. 사회주의 몰락 이후 동독 지역의 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인한 인구유출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2000년 당시, 동독에는 100만호의 과잉주택이 있었다. 연방정부는 과잉주택대책을 중심에 둔 축소도시정책을 내세웠다.
동독의 모든 도시들이 축소도시를 경험한 것은 아니다. 1990년 통일 이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경제회복과 인프라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동독 도시들의 상황은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 특히 Dresden, Leipzig, Jena의 상황이 많이 호전되었다.
한편 구 서독지역은 탈산업화의 전환기속에서, 1970년대부터 구 산업지역이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후 제조업, 석탄산업 등 전통적 산업기반이 침체되면서 축소도시가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루르(Ruhr) 지역’이다.
이후 독일은 계획적 차원에서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공간적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정치구조가 계획시스템에 반영된 탓에 지역계획(regional planning)이 전통적으로 강하다. 또 상향식 참여를 강조하는데, 이는 지방정부가 지방의 목표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고, 전략적 조정을 통해 윈윈을 할 수 있다는 신념 때문이다.
독일의 1994년도 도시정책은, 인구감소화시대의 도시의 미래상을 주제로, 도시의 형태를 컴팩트하게 할 것을 주창한 ‘올보 헌장(Aalborg Charter)’을 수용하여, 연방정부는 밀도, 용도혼합, 다(多)중심성을 기본구조로 정했다. 이어 1996년 연방정부와 노르트라인 웨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는 컴팩트한 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원칙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축소도시의 도시정책이 적용된 예로는 동독의 데사우(Dessau)市의 도시축소 전략(Stadtrueckbau)을 들 수 있다. 데사우시는 단일구조경제(mon-structured economy)에 기반한 노동집약적 도시였고, 1959년부터 주택부족이 발생했다. 그러나 통일 후 대규모 실업과 주택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에도 1990년 통일 때보다 높은 실업률, 공장폐쇄, 경제 투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데사우시는 보다 다양하고 작은 규모의 경제로 대체되고 있고, 공공 영역에서 직업이 창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