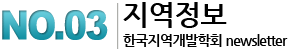다른 웹진 보기
'농촌의 날' 제정을 제안하며
 소진광(한국지역개발학회장, 가천대학교 부총장)
소진광(한국지역개발학회장, 가천대학교 부총장)
역사가들은 흔히 도시를 인류문명의 꽃으로 표현한다. 도시가 형성되기 전 인류의 집단생활을 상상하면 도시는 분명 혁신의 산물이다. 인류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영역을 배회해야했던 수렵·채취 시대를 마감하고 정착농업을 시작한 것은 인류 역사상 커다란 혁신이었다.
인간은 정착농업을 통해 수렵·채취 시대만큼 넓은 영역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하지만 정착농업도 일정한 배타적 영역 구분이 필요하다. 정착농업도 여전히 자연에 순응하는 인간활동이었기 때문이다. 자연조건에 따라 삶의 방식을 달리하던 인류문명은 산업혁명을 통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우선 생산량을 결정하던 자연조건이 인간이 만든 기술이나 장비를 통해 극복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자연조건의 극복은 마치 인간이 자연과 싸워 승리한 것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도시도 인류가 자연조건을 극복한 성공사례로 주목받게 되었다. 산업혁명은 근대도시의 탄생과 성장을 촉진하였다. 물론 농업시대에도 도시는 존재하였다. 농업시대의 도시는 도시 이외의 취락(주로 농촌)에서 생산된 재화의 소비공간 쯤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도시가 생산활동의 거점으로 기능하게 된 계기는 산업혁명을 통해 마련되었다. 산업화가 나라발전을 촉진하는 동력으로 작동하면서 산업화의 배경으로 성장한 도시는 인류문명의 발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공간이 되었다. 도시거주는 성공한 사람들의 상징이 되었고, 도시인구의 비율은 산업화의 척도로 국가발전 수준처럼 여겨졌다.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취락은 같은 시대 ‘공존의 비용’으로 관리되어야 할 국가 혹은 사회의 부담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즉, 농촌은 찬란한 도시문명의 그림자 혹은 그늘쯤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의 날’이 제정되고, 도시를 기리는 각종 행사들이 늘어났다. 한국도 2006년 매년 10월 10일을 ‘도시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분야별로 성공했거나 발전한 도시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10월 10일은 한국 최초의 신도시 수원화성이 축조된 날로 기록되고 있다. 오랫동안 농업에 의지해온 우리나라 역사를 고려하면 ‘도시화’ 자체가 경이로운 현상이고 도시의 모습이 곧 근대화의 표상으로 인식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도시는 선택받은 소수의 지도자가 거주하는 안식처요, 발전현상을 촉발하는 핵심 공간으로 축복받고, 찬양받을 만하다. 이와 같이 도시 자체가 인류문명의 중요한 설명자료라는 데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농촌을 포함하여 도시 이외 촌락의 존재가치를 부정할 경우 도시의 존립근거도 내세우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드물다.
우선 도시는 지구환경의 순환과정에서 촌락과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다. 도시도 인간 거주에 필요한 적정한 자연순환(natural circulation)을 필요로 한다. 요즘 기술발달로 도시농업이 가능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지구를 하나의 단위로 작동하는 환경을 고려할 경우 도시현상은 인류 서식환경에 커다란 부담이고 비용이다. 이러한 지구환경 부담은 도시 자체 안에서 해결될 수 없다. 인류가 도시현상만을 추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취락은 단순히 도시의 그늘진 구석이 아니라, 도시현상을 가능하게 만드는 동반자다. 즉, 도시의 존재가치는 취락의 존재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인정된다. 도시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취락의 역할이 필요한 셈이다.
도시현상은 도시에 거주하는 절대 다수의 시민들에게 일상처럼 느껴지게 되었다. 즉, 1년 365일이 도시의 날인 셈이다. 지역은 도시와 취락을 포함한다. 즉, 지역개발은 도시개발과 취락(농촌)개발을 모두 포함하는 공간변화 관리방식이다. 도시와 취락이 상호 보완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라면 절대 다수가 거주하는 도시를 축복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소수가 거주하는 취락(농촌)을 축복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축복은 올바른 기준을 확인하는 행사이다. 따라서 축복의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공간활용의 정당성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 도시현상이 인류문명의 ‘지속 가능성’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유일한 인류 서식처인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농촌의 존재가치가 재평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산업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 50.2%였던 도시화율은 산업화가 절정에 달했던 1985년 77.3%로 급상승했고, 1990년 82.7%, 1995년 86.4%, 2000년 87.8%, 2005년 89.8%, 그리고 2010년 90.6%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기간에 크게 높아졌다. 도시 이외의 취락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그만큼 작아지고 있는 셈이다. 즉,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다. 열 명중 아홉 명꼴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함께 도시현상을 자축할 수 있어도, 채 한 명꼴도 안 되는 농촌 거주 사람은 자축할 수도 없다. 이제 ‘농촌의 날’을 만들어 그때만이라도 모든 국민이 농촌의 고마움을 되새기고, 열 명중 한 명꼴도 안 되는 농촌 사람의 역할을 기려야 한다.
농촌의 역할 없이 도시의 찬란한 문명을 떠올릴 수 없다. 유독 어느 특정한 날짜를 잡아 도시를 떠올리고, 축복하는 행사는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생일을 기리는 것과 같을 것이다. 생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당사자의 날이자, 낳고 기른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이기도 하다. 도시의 존재가치는 취락(농촌)의 반사적 현상에서 비롯된다. 절대 다수가 거주하는 도시화 시대엔 도시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고, 도시와 보완적 관계에 있는 농촌의 가치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인류문명의 발전’을 학문적 대상으로 하는 한국지역개발학회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농촌의 날’을 제정하고 농촌의 존재가치를 재평가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